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tartup Center Singapore)는 ‘싱가포르 인공지능(AI) 정부정책 및 주요 산업별 AI 기술동향’이라는 보고서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하였으며, 이번에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AI 정책 및 한국 기업의 진출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싱가포르가 AI 강국을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23년 발표된 National AI Strategy 2.0(NAIS 2.0)은 “공익을 위한 AI(AI for the Public Good)”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윤리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디지털 경제가 이미 GDP의 17.7%를 차지하는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AI 시장 규모만 약 160억 달러(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작은 도시국가가 동남아 전체 AI 확산의 실험장이자 교두보로 주목받는 이유다. 이 전략은 단순히 기술 경쟁력 확보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싱가포르가 ‘신뢰할 수 있는 AI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태계싱가포르 AI 생태계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정책 주도와 민간 혁신의 결합이다. GovTech, IMDA, A STAR 같은 공공기관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며, AI Verify와 같은 신뢰성 검증 툴킷으로 기업의 윤리적 기준 준수를 지원한다. 호프스태터가 ‘괴델, 에셔, 바흐’에서 강조한 ‘기묘한 고리’(Strange Loop)처럼, 싱가포르의 AI 생태계도 정부 정책–산업–규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반복적 순환을 이루며 점점 더 고차원적인 혁신을 만들어낸다. 단순한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고 강화하는 루프 구조가 새로운 창의성을 낳고 있는 셈이다. ▲의료∙바이오 헬스 ▲핀테크 ▲공공 행정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제조 ▲에듀테크 ▲ 인프라 등 7대 분야를 AI 주요 사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료와 공공 행정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수요 창출로 고성장을 보이고 있고, 핀테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과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하고 이미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폭발적 성장보다는 고도화 중심으로 전환중이다. 스마트 제조·모빌리티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성장 잠재력이 크다. 정부는 AI 인재 양성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2026년까지 1만 5000명의 AI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글로벌 기업과 현지 산업의 교차점싱싱가포르는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향후 5년간 10억 SGD(1조1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GPU 기반 데이터센터 확충, 국제 공동 프로젝트, 전문 인재 육성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이 AI 인프라를 제공하고, 현지 스타트업은 특화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한다. 바흐의 푸가가 단순한 선율의 반복 속에서 복잡한 음악적 구조를 만들어내듯, 싱가포르의 AI 정책도 각 산업에서 단편적 혁신을 쌓아 올려 점차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복합적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AI는 여전히 규칙 기반 알고리즘의 집합이지만,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인간의 창의성에 가까운 산출을 흉내 내며 산업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한국 기업에 싱가포르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다. 첫째, 공공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실증 경험은 곧 신뢰 자산으로 전환되어,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인근 시장 확장의 발판이 된다. 둘째, 자연어처리(NLP), 의료 영상, 예지정비 같은 틈새 분야에서 특화 기술을 적용하면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 셋째, 정부와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는 협력 구조 속에서 파트너십 중심 접근이 필수적이다. 독자적 진출보다는 공동 프로젝트 참여가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괴델이 보여준 정리처럼, 어떤 체계도 스스로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AI 역시 기술 그 자체로는 자기완결적이지 않다. 싱가포르가 ‘공익을 위한 AI’를 내세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이 사회적 맥락, 윤리적 틀과 결합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나라·큰 실험실…한국 기업이 배워야 할 것들 싱가포르는 국토는 작지만, AI 정책·규제·산업을 아우르는 거대한 실험실로 기능하고 있다. 윤리적 기준과 신뢰를 강조하는 이 시장은 단순한 기술 판매처가 아니라 혁신 모델을 검증하고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에셔의 그림 속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처럼, AI는 반복과 규칙을 기반으로 끝없이 확장된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 창의성과 동일한지는 여전히 열려 있는 질문이다. 한국 기업이 자사의 기술을 싱가포르 특화 분야에 접목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함께 이 ‘기묘한 고리’에 참여한다면, 동남아 AI 시장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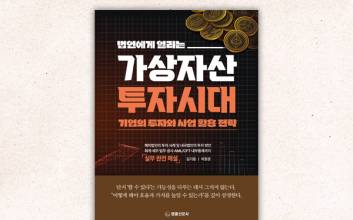
![실패한 창업가가 기록하는 도전과 실패 그리고 새로운 출발 [새로 나온 책]](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5/10/15/ecn20251015000010.353x220.0.jpg)
![“시작이 곧 위대함의 출발점” 김명진 대표가 찾은 답 [CEO의 서재]](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5/09/05/ecn20250905000060.353x220.0.jpg)
![AI 허브로 진화하는 싱가포르, 한국 기업의 전략적 교두보 되나 [동남아시아 투자 나침반]](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5/09/29/ecn20250929000030.353x220.0.jpg)
![만화 ‘검정고무신’은 왜 불공정계약의 대명사가 됐나[백세희의 컬처&로(LAW)]](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5/10/10/ecn20251010000048.353x22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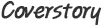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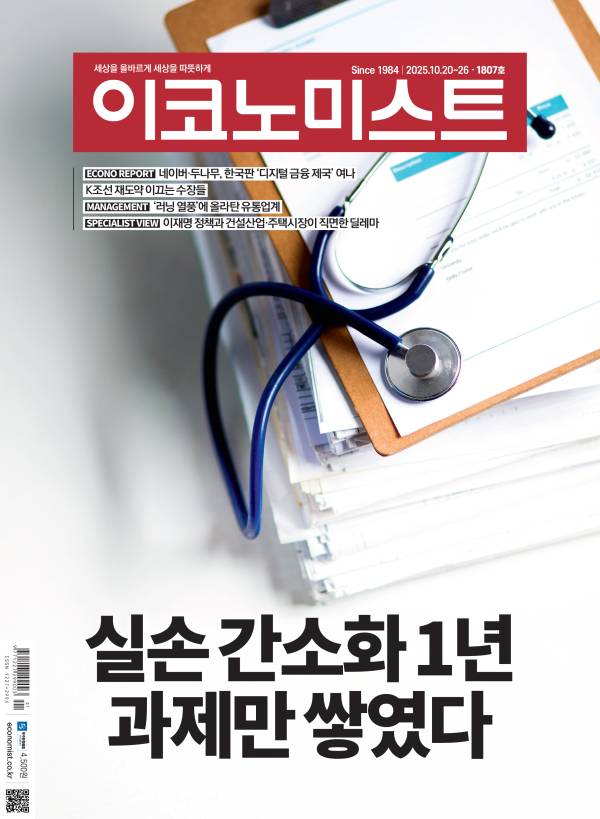
![도로 위의 크리에이터, ‘배달배’가 만든 K-배달 서사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9/25/isp20250925000152.400.0.jpg)
![비혼시대 역행하는 ‘종지부부’... 귀여운 움이, 유쾌한 입담은 ‘덤’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0/02/isp20251002000123.400.0.jpg)


